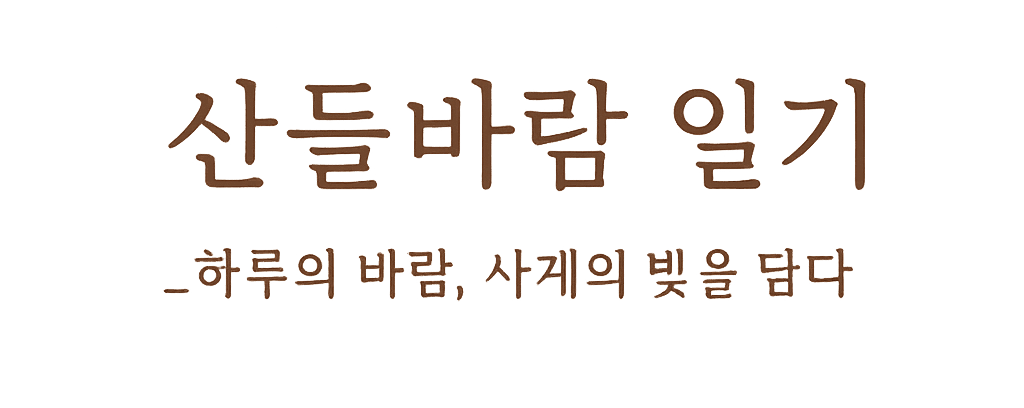“산들바람 일기-그시절, 우리는 서로가 전부였다”
📌 유년의 산하에서 다시 피어난 기억들.
🌾그 시절,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날들
가끔은 마음이 고단해질 때면,
나는 아주 멀리 돌아가봅니다.
명산이, 희남이, 우범이, 삼현이, 명기, 재영이, 명구, 명숙, 돈영이…
이름만 불러도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 얼굴들.
그 시절 우리는 서로가 친구였고, 형제였고, 세상이었습니다.
그때 우리는
돈은 없었지만
웃음은 늘 넘쳤고
가진 건 없었지만
마음은 늘 배가 불렀습니다.
🍘 검댕이 묻은 얼굴, 검정 고무신, 그리고 가난이라는 배경
어린 시절의 나는 늘 침을 흘려 턱밑에 때가 잔뜩 껴 있었고
세수를 하지 않아 얼굴엔 햇볕을 머금은 검댕이가 가득했죠.
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.
그건 그저 그때의 나였으니까요.
달콤한 간식은 귀했고
덕분에 치아는 누구보다 성했습니다.
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요.
검정 고무신은 늘 뒤축이 닳아
허둥지둥 걷다 넘어지기 일쑤였고,
그래도 그 고무신 한 켤레만 있으면
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
🍘 학교에서 나눠 먹던 건빵 한 봉지의 기쁨
점심시간이 되면 가끔 학교에서 건빵을 나눠주던 날이 있었습니다.
그 작은 건빵 하나 하나가 그렇게나 귀하고 설렜던 이유는
그 안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
누가 많이 먹었는지,
누가 한 개라도 더 받았는지,
그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.
지금처럼 풍족한 시대에는
아마 그 기쁨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.
🎯 구슬치기와 딱지, 연실, 그리고 서툴렀던 용기
어느 겨울날,
구슬치기를 하다가 남의 집 요강을 깨뜨렸습니다.
그날 등짝을 얼마나 맞았던지
등에 난 줄이 저녁까지 뜨거웠죠.
하지만 다음 날 또 구슬을 들고 나갔습니다.
그냥… 놀고 싶었으니까요.
또 어떤 날은
연을 너무 열심히 날리다
유리병에 감겨둔 연실이 깨져
팔뚝이 쭉 베였습니다.
선명한 피색에 놀랐으면서도
연싸움에서 질 수 없어서
붕대도 대충 감고 다시 들판으로 뛰어나갔죠.
그리고 연이 끊어지면
우리는 바람 따라 뛰었습니다.
들판 끝까지, 개울 너머까지.
연을 되찾는 일은 마치
우리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.
🔥 쥐불놀이하던 밤, 불꽃처럼 타오르던 웃음
정월 대보름이 다가오면 좁디 좁은 벌판에 나가
우리는 깡통에 불씨를 넣어 허공에 원을 그렸습니다.
휘돌아가는 불의 궤적은 마치 별이 땅 위로 내려온 것 같았지요.
그러다 실수로 불을 내게 되어
몇몇은 도망치고, 몇몇은 숨고,
남은 며칠은 동네가 술렁였습니다.
그럼에도 이상하게
그 밤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.
불꽃 때문일까요,
아니면 그때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일까요.
🌙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
그 시절은 부족했고, 거칠었고, 투박했습니다.
하지만 그 속에는
서로가 있었고, 웃음이 있었고, 사랑이 있었습니다.
지금의 나는
그 기억들을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.
때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따뜻한 시절.
가난했지만 풍족했고,
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.
그 시절의 나는
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
“괜찮아.
너는 이미 사랑받았고
이미 행복했던 사람이야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