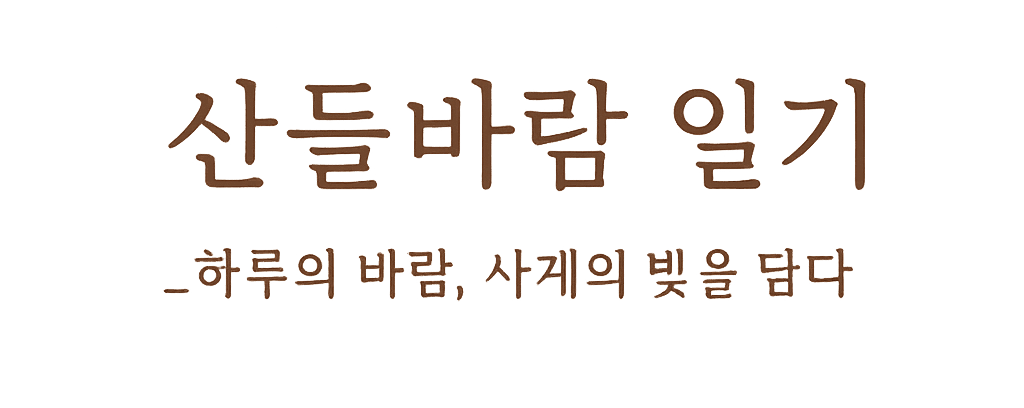“산들바람 일기-그시절 숨이 차오르던 심부름들”
봉화산 아래 살던 그 시절,
나는 참 심부름이 많은 아이였다.
점심때만 되면 어머니가 부르셨다.
“얘야, 주전자 들고 담안집 우물가에서 물 좀 떠와라.”
그 말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다.
주전자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 내리는 길은
늘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상쾌했지만,
내 마음은 괜히 무거웠다.
가다 뱀이라도 만나면…
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.
뱀의 그림자만 스쳐도
나는 주전자를 던져놓고 뒤도 안 보고 뛰어 돌아왔다.
그럼 또 어머니는
“에구, 겁쟁이. 또 가라.”
하시며 웃으셨다.
나는 다시 주전자를 들고,
겁을 삼키며 걸어 올라갔다.
학교가 끝나면 이제 놀 시간이다… 싶었던 것도 잠시,
“얘야, 소 데리고 풀 좀 먹이고 와라.”
소는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.
친구들은 냇가에 가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지만
나는 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
지루함과 부러움 사이에서
풀보다 천천히 시간을 씹었다.
주말이면 더했다.
화전밭에서 올라오는 콩 싹을 비둘기에게서 지켜야 했다.
찌그러진 깡통이나 세수대야를 들고
“훠어이! 훠어이!”
소리를 질러대며 산비탈을 뛰어다녔다.
놀고 싶은 마음이 콩잎보다 여린 줄
그때는 아무도 몰랐다.
그러나 무엇보다 심장이 가장 뛰던 심부름은 전화 심부름이었다.
그 땐, 마을에 전화가 한 대뿐이었다.
그 전화기는 큰집에 있었다.
어느 날이면
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우리집으로 성큼 내려오셨다.
문을 “턱” 열고 외치셨다.
“야야! 누구네 아부지 전화 왔다!
빨리 가서 받으라 해라!”
출처 입력
그 말이 떨어지면
나는 숨을 들이키기도 전에 이미 뛰고 있었다.
비탈길을, 논두렁을, 고갯마루를
그냥 있는 힘껏.
발이 땅을 딛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.
숨이 목에 걸려 헉헉거리면서
큰집 마루에 도착하면
큰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.
“허 참, 누가 보면 죽는 줄 알겠다.”
나는 그저 숨을 몰아쉬며
구석에 놓인 검은 전화기 앞에 앉았다.
기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
그렇게 소중했던 시절이었다.
막배가 들어오는 날이면
우편물도 동네에 배달해야 했다.
원래 큰형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
어찌된 영문인지
형은 그 시간만 되면
늘 바쁜 사람이 되었다.
결국 동생들이 뛰었고,
형은 모르는 척 했다.
지금 생각해보면
그 형의 슬쩍 빠져나가는 솜씨는
참 기가 막혔다.
그땐 억울했는데
이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
그저 피식, 웃음이 난다.
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,
억울하고,
서러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일들이었다.
그런데 이상하다.
지금은 그 모든 일이
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낸다.
뱀을 보고 도망치던 길,
소 옆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오후,
콩 싹 지키던 연기 냄새,
큰집 전화기 때문에 뛰던 숨소리,
우편 봉투에 묻어있던 햇빛 냄새.
그 모든 것이
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었다.
이제야 안다.
그 시절은,
그 마음은,
그 심부름들은…
그저 고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.
봉화산 아래,
바람이 머무는 그 마을처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