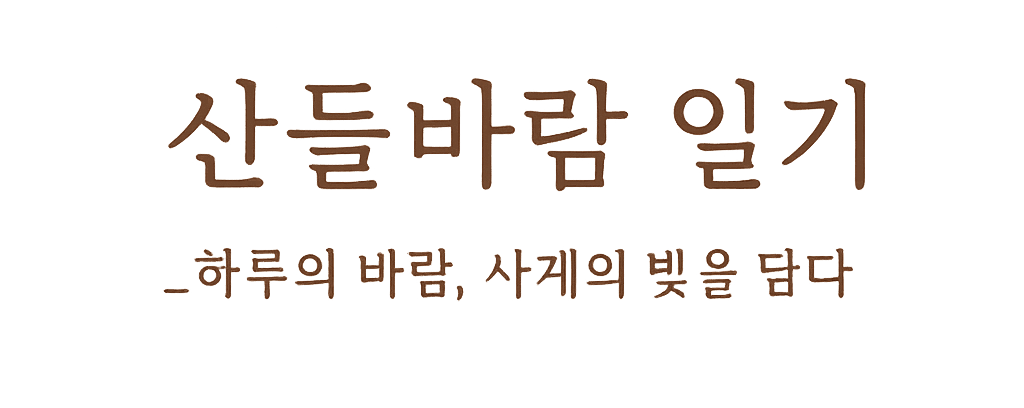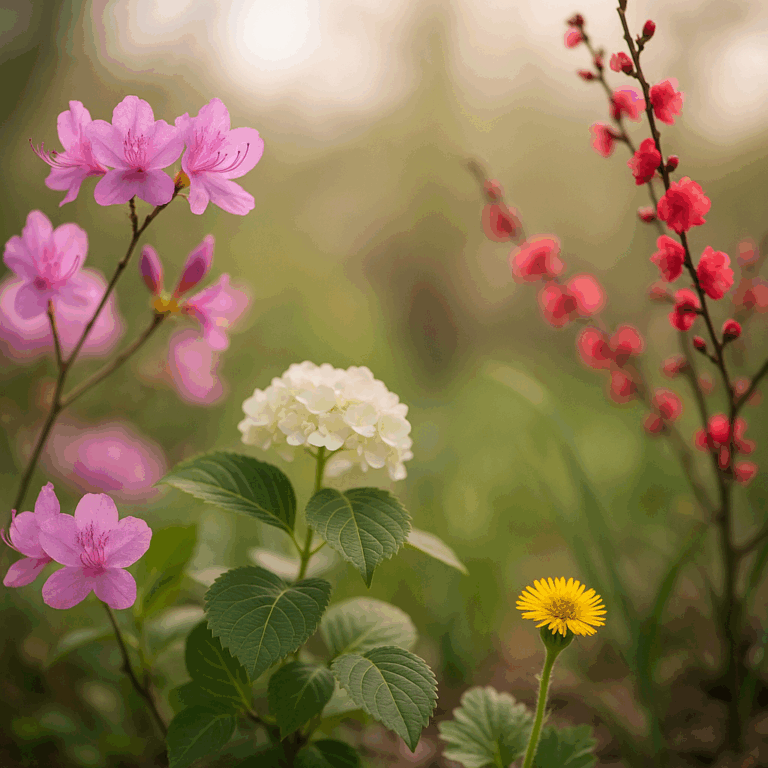“산들바람 일기-문을 열자 스치는 가을 냄새”
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닿은 가을 냄새.
차가운 공기가 후욱— 하고 폐 속으로 들어올 때, 어김없이 그 시절이 떠오른다.
하얗게 입김이 피어오르던 골목길,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밤을 주우러 나서던 어린 나의 가을 새벽.
그때의 냄새는 지금도 생생하다.
서늘한 흙냄새,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섞인 나무향,
그리고 동네마다 피워 올리던 나무타는 냄새까지.
그 모든 것이 섞여 코끝을 간질이며,
“가을이야.” 하고 속삭이던 그때의 공기.
밤을 주우며 주머니 속 손끝이 살짝 시려왔던 그 시절,
땅 위로 떨어진 밤송이를 발끝으로 굴리며
“이건 내 거야!” 하고 웃던 친구들의 목소리까지
가을 공기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듯하다.
그 시절의 가을 냄새는
차가운데 따뜻했다.
얼음처럼 맑은 공기 속에,
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의 마른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으니까.
그 냄새는 언제나 **‘따뜻한 추위’**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.
이제는 그때처럼 밤을 주울 일도, 손이 얼 만큼 밖에 있을 일도 없지만
문을 여는 순간 스치는 냄새 하나에
그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.
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
내 유년의 온기,
시간을 거슬러 오는 그리움의 향기다.
🕯️ 가을의 냄새는 결국, 기억의 냄새다.
어릴 적의 추위, 아버지의 털신, 군고구마의 김,
그리고 까맣게 빛나던 밤알 하나.
그 모든 게 모여
오늘도 문틈 사이로 조용히 흘러들어온다.